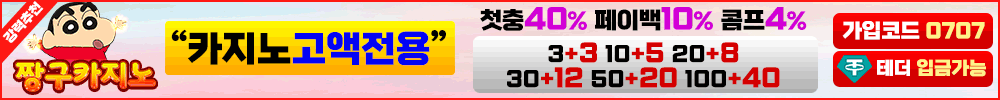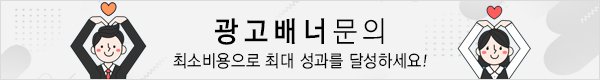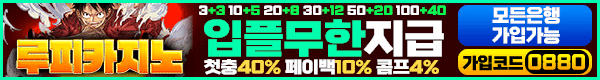대법 "보상금 결정 확정 전에 국가 상대 손배청구 소송은 잘못"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50
본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순직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본안에 관해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2014년 5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모 연대 전투지원중대로 전입한 후 통신병, 취사병, 계산병으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육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4년 12월 A씨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를 했지만,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어머니 B씨와 아버지 C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무청 복무부적합검사와 입영 후 실시한 각종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 이미 A씨가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A씨의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A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 각 4600여만원씩 모두 9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같은 판결 내용을 토대로 B씨는 2016년 7월 전공사상 재심사를 청구했고, 국방부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순직Ⅲ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유족대표자로서 2017년 5월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9300여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1400여만원만 지급하자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며 공제한 사망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 첫 번째는 군인의 사망사고와 관련 국가배상을 받은 이후 군인연금법상 보상급여를 청구했을 때 보상급여에서 배상받은 국가배상액 전액을 공제해야 할지, 아니면 일실손해액(사망으로 인한 장차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상실분)만 공제해야 할지가 다퉈졌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상 보상급여와 관련, 보상급여신청 및 그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 없이 곧바로 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이 가능할지가 문제됐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 1심은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공제한 93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연금법상 보상금과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공제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국방부의 1억700여만원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고 보고 당사자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순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더구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그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였어 한다"며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